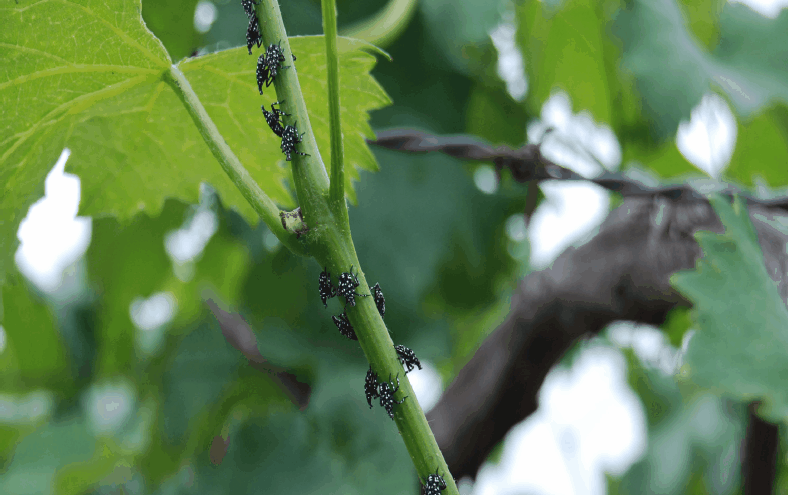2010년 11월 16일 화요일
2010년 11월 13일 토요일
2010년 11월 9일 화요일
2010년 11월 8일 월요일
중국 전통 의술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천산갑

온 몸에 비늘이 덮흰 희귀한 야생 포유동물 천산갑(pangolin)의 보르네오 내 불법 밀거래의 규모가 드러났다.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사이, 밀수업자는 적어도 22,200마리의 멸종위기에 처한 말레이 천산갑(Sunda pangolin 또는 scaly antheater)을 잡아 죽였고, 비늘만의 양으로 치자면 거의 1톤 가량을 팔아 치웠다.
반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현지 경찰은 선적된 천산갑 654마리를 적발했을 뿐이다. 국제야생기금(WWF)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연합하여 구성한, 야생생물 무역 감시 단체인 '밀거래(Traffic)'에서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이 종의 지속적인 생존이 심각한 걱정거리로 떠올랐다."고 한다.
천산갑은 포유류로는 유일하게 비늘이 덮인 동물이고, 이 비늘이 중국에서는 귀하게 취급된다. 중국인들은 비늘은 가루로 갈거나 목걸이로 만들어 부적으로 지니고 다닌다고 한다.
중국 민간 요법에 따르면, 천산갑 비늘은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천식 등의 질병에 따른 다혈증을 치료하고, 생리불순과 수유장애, 관절염을 치료한다."고 믿는다. 천산갑 고기도 중국인들은 보신용으로 취급한다.
8종의 천산갑 개체군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멸종위기에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CITES)」은 2000년에 아시아에 서식하는 4종의 천산갑을 모두 무역 금지 목록에 올렸는데, 이 중 중국 천산갑(Chinese pangolin)과 말레이 천산갑(Sunda pangolin)은 2008년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적색 목록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고, 모든 국제 거래가 불법이다.
한 마리 당 16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과 유일한 방어가 몸 움크리기인 탓에 잡기가 아주 쉬워서 천산갑 사냥은 근절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중국인의 미개한 치유 신앙과 야만적인 보신 문화 때문에 애꿎은 생물만 멸종위기에 처했다.
※ 참고
"Rare scaled mammal threatened by traditional medicine". New Scientist. 2010-10-30.
"'천산갑' 100마리, 中식당 냄비행 위기 탈출". 중앙일보. 2007-11-12.
Press release. "Traffic - "Seized notebooks give unique insight into scale of illicit pangolin trade".
www.traffic.org. Retrieved 2010-10-28.
2010년 11월 6일 토요일
북한산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집고양이

북한산 국립공원 내 사패산 정상 서쪽으로는 박리돔이 서 있어 낭떠러지이고, 동쪽 사면은 비교적 완만하고 숲이 우거져있다. 이 동쪽사면에서 집고양이를 발견했다. 탐방객 주변을 서성이며 먹이를 찾고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고양이나 너구리 같은 포식자가 증가해도 새 둥지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 환경에서는 다르다. 고양이 같은 포식자가 늘어날수록 새 둥지 피해가 커진다.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는 오색딱따구리, 쇠딱따구리 같은 귀한 새들이 많이 산다.
참고☞ 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10/09/100923125117.htm
도시에서는 고양이가 쓰레기만 뒤져도 쉽게 먹이를 찾을 수 있으므로 힘들게 새 둥지를 사냥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야생에서는 등산객에게 얻는 먹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북한산의 집고양이는 적극적으로 야생동물들을 사냥해야 할 것이다.
이미 야생화된 집고양이는 생포해도 사람이 기르기가 힘들다.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포획해서 북한산 생태계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양이는 북위 +37° 43' 24.52", 동경 +127° 0' 41.33" 부근을 영역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었다.
2010년 10월 30일 토요일
진핵세포의 핵은 바이러스?
 |  |

미미바이러스.(출처:wikipedia, 저자: Xanthine,이용조건: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2.5 Generic license.)
2010년 10월 27일 수요일
O형 혈액의 여성, 임신 잘 안되는 것으로 밝혀져

여성의 혈액형이 임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에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연구에서는 난포자극호르몬(FSH: follicle-stimulating hormone)의 혈중 농도가 임신 가능성의 지표로 쓰였다. FSH가 1리터 당 10단위 이상이면 난소기능저하라고 할 수 있다.
연구팀은 나이와 체질량을 보정한 후, 평균연령 35세이고 45세 이하 56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FSH를 측정한 결과, 혈액형이 O형일 경우 FSH 수치가 10 이상인 여성이 다른 혈액형의 여성보다 두 배나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의미로 보면, A나 AB형 여성은 이 같이 높을 가능성이 O형에 비해 절반이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기사
"Type O blood may be a fertility barrier". New Scientist. 2010 October 26.
"Blood group can affect fertility, study reveals".The Guardian. 2010 October 25.
2010년 10월 22일 금요일
낙지가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결론은 마찬가지

서울시가 조사한 연체동물
서울시가 조사한 낙지 중 국산 낙지 3마리 중 1마리가 중국산으로 밝혀졌다. 그래도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임의로 정한 '낙지내장 카드뮴 기준'인 2mg/kg을 모두 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국내산 낙지 3마리를 조사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중국산으로 밝혀졌는지 모르겠으나, 6번 생물낙지 5.7mg/kg, 7번 생물낙지 20.3mg/kg, 8번 활낙지 9.9mg/kg로,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모두 2mg/kg을 훌쩍 넘어버린다. 그러므로, 서울시가 낙지내장 기준인 2mg/kg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장을 굽힐리가 없다.
설사, 모든 낙지가 중국산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국산 낙지의 내장만 검사하면 또 2mg/kg 넘게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낙지 다음에는 꽃게, 대게, 홍게, 조개, 소라의 내장 차례이다.
식품의 위해물질 허용기준은 해당식품의
1. 총식이조사(TDS : Total Diet Study)로 국민 전체의 식품평균섭취량을 구하고,
2. 식품의 카드뮴 함량의 평균을 구하고,
3. JECFA(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 WHO/FA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 위원회)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카드뮴은 7 μg/kg b.w/week) 대비 위해도(%)를 산출하고,
4. 이에 따라 허용치를 정하게 된다.

낙지는 내장에 카드뮴이 집중(집중도 98%)되어 있고, 전체 낙지의 기준치를 2mg/kg으로 정했다. 낙지내장은 낙지에서 10%이하이므로, 낙지내장만으로 기준치를 정하려면 현행 낙지기준의 10배인 20mg/kg이 합리적이다. 서울시는 상식적인 계산도 안 해보고 "과학적 진실"을 운운하며 과학을 왜곡했다.
멸치도 카드뮴이 내장에 집중되어 있을텐데, 멸치를 통째로 먹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멸치 내장만 모아서 검사하면 당연히 카드뮴 수치가 더 높게 나오기 마련이다. 새우, 가재, 꽃게, 홍게, 대게, 전복, 소라, 조개들도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내장만 빼서 조사한다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수산물이 없을 것이다.
서울시가 앞으로도 해산물을 검사할 계획이라는 데, 그 때마다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야 할 것이다.
"멸치 국물 우려 낼 때 내장은 제거하고 우려내세요."
"새우 먹을 때 내장부위를 제거하고 드세요."
"간장게장 먹을 때 게다리만 드시고 몸통은 버리세요."
"소라 먹을 때 내장 있는 끝부분은 떼고 드세요.."
"서울시에서 조갯국 끓일 때 조개내장 제거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림출처=식약청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의 카드뮴 노출에 기여하는 식품은 곡류>채소류>육류>어패류>과일류 순이고, 카드뮴 섭취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식품은 쌀이다.
이 블로그의 이전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나라면 카드뮴 '낙지 머리'는 먹고 대신 쌀밥을 줄이겠다."
※
'낙지내장'이라는 식품이 있다고 가정하고 서울시 검사결과를 토대로 위해도를 산출해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 : 식약청 보도자료 2010.9.30, 식약청 보도자료. 2010.09.14.)
서울시 카드뮴 검사결과에서 낙지의 먹물과 내장 비율 10%, 카드뮴은 몸통에서 0이고, 모두 내장에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따라서 낙지의 주간 평균 섭취량은 5.490g이므로, 낙지내장 평균 섭취량 0.549g/week, 서울시 검사 낙지내장 9건의 평균 카드뮴 함유량 13.6mg/kg이고,사람 평균체중 55kg이다.
낙지내장으로 인한 국민의 카드뮴 노출량=(13.9mg/kg * 0.549g/week)/55kg b.w=0.1387472μg/kg b.w/week 이다.
PTWI 대비 위해도(%)를 산출해보면
위해도(%)=카드뮴 노출량((μg/kg b.w/week)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μg/kg b.w/week)) 이므로
(0.1387472μg/kg b.w/week)/(7μg/kg b.w/week)*100= 1.9821%
가 나온다.
※참고
"연체류·갑각류 중금속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식약청 보도자료. 2010.9.30.
"연체류·갑각류 및 패류 중금속 오염 실태조사 실시". 식약청 보도자료. 2010.09.17.
"설명자료(낙지머리(내장) 중 카드뮴 기준치 검출 보도관련)". 식약청 보도자료. 2010.09.14.
"낙지머리 속 먹물, 내장에 중금속 많아요!".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0.09.13.
"전복도 안심하고 드세요 !!". 식약청 보도자료. 2010.10.05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중 카드뮴이란?>.2007.
2010년 10월 20일 수요일
북한산 둘레길 중 순례길 구간에서 버섯 채취하는 사람




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이침(耳針)의 기원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Phrenology |  출처 : http://www.nouvellescles.com/article.php3?id_article=1382 |
 |  |
2010년 10월 13일 수요일
[주간 동아]의 구당 김남수의 미스테리 시리즈
어린이 미라

2010년 10월 12일 화요일
포획-재포획 법으로 개체군 크기 추정하기




2010년 10월 11일 월요일
고대 페루인들도 침맞고 뜸뜨고...
 |  |  |
2010년 10월 10일 일요일
뎅기열 방지 모기, 호주와 베트남에 방사

▲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출처:http://ja.wikipedia.org/wiki/ヤブカ)
2010년 10월 4일 월요일
인공수정, 남녀성비를 바꾼다.

▲세포질내정자주입(ICSI).(출처=http://en.wikipedia.org/wiki/File:Icsi.JPG)
2010년 9월 27일 월요일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닥나무'의 황당한 영어 표기



▲'닥'을 'Tak'으로(왼쪽), 귀를 Kwi가 아닌 'Returning'으로 번역한 국립현대미술관.(출처: 국립현대미술관 웹사이트)

▲뽕나무에 열린 오디.(출처: wikipedia/Jean-Pol GRANDMONT)

2010년 9월 16일 목요일
"나라면 카드뮴 '낙지 머리'는 먹고 대신 쌀밥을 줄이겠다."

[프레시안]이라는 매체에 "나라면 카드뮴 '낙지 머리'는 먹지 않겠다"는 아주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형편없는 기사가 떳다.
"이번에 서울시가 분석·발표한 낙지와 문어 머리(내장)에 들어있는 카드뮴 양은 한 달에 한번을 먹더라도 유럽연합 식품안전국(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이 허용한 기준을 훨씬 웃돌기 때문이다."
라며, 그래서 글쓴이는 먹지 않겠다고 한다.
2009년 3월 20일자로 배포한 유럽연합 식품안전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새로운 카드뮴 주간섭취허용량(tolerable weekly intake; TWI)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유럽연합 주간섭취허용량이 사람몸무게 1kg당 2.5ug, 즉 60kg 성인이 1주일에 카드뮴을 150ug까지 허용되므로, 29.3㎎/kg이 검출된 중국산 낙지를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에 낙지 내장을 5g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
낙지 한 마리를 200g이라고 하고, 낙지의 내장비율을 10% 정도 이므로 내장 무게가 20g이므로 앞의 중국산 낙지를 기준으로 하면, 내장에 카드뮴 0.586mg이 나오며, 내장 5g 일때 약 0.1465mg(146ug)이므로 계산은 대충 맞아떨어진다.
그러면서,
"카드뮴 섭취는 낙지 머리(내장)와 먹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해산물과 각종 채소와 곡류를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실제로 낙지 머리는 일주일에 2~3g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낙지 한 마리가 아무리 작아도 20~30g(보통은 150g 이상)은 족히 될 터이므로 한 달에 한 번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결론은 적어도 낙지 머리는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된다"
고 한다. 낙지에서 카드뮴은 거의 다 내장에만 축적되어 있으므로 위의 인용문을 내장으로 해석하면, 200g 낙지 한 마리 내장이 대략 20g이므로 유럽 기준으로 살려면 대충 맞는 말 일수도 있겠다.(150g은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참에 나는 맛있는 낙지를 포기하지 않고, 쌀밥을 포기하기로 했다.
쌀의 카드뮴 허용치는 0.2mg/kg이다.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은 약 100g이므로 일주일에 7 공기면 140ug으로 괜찮고, 8 공기를 먹어버리면 160ug으로 유럽의 카드뮴 주간섭취허용량을 넘어 버린다.
기사에 따르면 "카드뮴 섭취는...다른 해산물과 각종 채소와 곡류를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실제로" 쌀밥은 일주일에 2-3 공기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WHO의 카드뮴 주간 섭취량은 7ug/kg으로 유럽보다 관대한데, 몸무게 60kg 기준으로 주간 0.42mg(420ug)이다. 이를 쌀로 환산하면 21kg(=카드뮴 0.42mg), 즉 밥 21 공기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음식으로 카드뮴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일 3끼 꼬박꼬박 밥 한 그릇을 먹는 것만으로 관대한 WHO 카드뮴 기준을 채워버린다. 그래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 사람들보다 체내 카드뮴량이 월등히 많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카드뮴 없는 쌀을 개발하고 있다.
카드뮴은 일반적으로 육류보다는 채소와 곡류를 통해 많이 섭취하게 된다. 유럽연합 식품안전국도 채식주의자들은 카드뮴 섭취량이 주간허용량을 2배 초과하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카드뮴 때문에 낙지 대가리로 고민하지 말고, 이 참에 쌀밥과 채소를 확 끊는 것이 "이타이이타이병이나 단백뇨, 골연화증,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더 현명한 방법이다.
*참고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일본, 식품중의 카드뮴 대책에 관한 금후의 연대에 관하여>.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미국, 수은: 쌀이 위험할 수 있음>.
[한국일보]. 2006.9.5. <폐광 관리않더니… '중금속 쌀'이 식탁에>.
[메디컬투데이]. 2008.10.13.<작년 카드뮴오염 쌀 2t 폐기>.
[YTN].2004.9.21.<'카드뮴 오염 벼 3년간 78t 폐기'>.
2010년 9월 15일 수요일
낙지 카드뮴 대가리 논란에 부쳐

2010년 8월 30일 월요일
[스크랩]외래종 꽃매미의 습격, 경계 필요
외래종 꽃매미의 습격, 경계 필요
▲ 꽃매미 성충. 몸길이는 약 2cm이다. (서울 초안산=직접 촬영)
중국산 외래종으로 생태계 피해 우려
아열대성 외래곤충 꽃매미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로는 꽃매미가 치악산, 계룡산, 내장산 국립공원에 이미 정착했으며, 나무에 잎마름을 유발하는 등 이미 생태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꽃매미는 1932년 우리나라에 문헌상으로 보고되었으나 이후 발견된 적이 없다가 2004년 천안에서 처음 나타났다. 그 후 2006년 서울 경기지역 도심에 확산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이 곤충의 생김새에 따라 '주홍날개꽃매미'라 불렀으나 현재 학계에서는 '꽃매미'로 고쳐 부른다.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추정한다.
이름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꽃매미는 매미가 아니다. 매미는 매미과에 속하는 생물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 꽃매미는 매미과가 아닌 꽃매미과에 속한다. 따라서 매미와 달리 공명판이 없어 울지 않으며, 땅속 생활도 하지 않는다.
매미와 달리 땅속 생활을 하지 않아
꽃매미는 매년 발생하며 나무줄기 등지에서 알 상태로 겨울을 난다. 올해 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영하 20도 이하의 추위가 지난 다음 꽃매미 알을 채집해 실험실 조건에서 부화하는 것을 관찰하여 올해도 꽃매미가 대 유행하리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알은 보통 4월 말쯤에 부화한다. 갓 알에서 깨어나면 몸통이 흰색이지만 곧 검은 바탕의 흰 반점으로 덮인 상태로 3번의 허물을 벗고 나면 붉은색 등에 검은 반점을 띈 약충(불완전변태를 하는 곤충의 애벌레를 일컫는 말)으로 변한다. 한 번 더 허물을 벗으면 성충이 된다.
성충은 대략 7월 초부터 활동을 하고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산란한다. 알은 길이가 3mm 정도이며, 주로 나무줄기에다 한 번에 40개 정도 여러 줄을 지어 낳는다. 저온으로 죽을 때까지 성충 한 마리가 낳는 알은 약 400개이다.
▲ 수액을 빨아먹고 있는 꽃매미 약충 (사진=국립환경과학원. [한국의 주요 외래생물 II])
수액을 빨아 먹어 나무에 피해를 입혀
꽃매미는 약충과 성충 모두 나무 수액을 빨아먹고 산다. 꽃매미는 특히 가죽나무와 포도나무를 좋아한다. 따라서 대 번성할 경우 나무의 집단 고사나 포도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설물 탓에 그을음병이 발생한다. 그을음병은 당을 먹고 자라는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여 과일이 상하게 되는 병으로, 꽃매미 배설물에는 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배설물이 과일 위에 떨어지면 그을음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농업의 피해뿐만 아니다. 꽃매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다른 나무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연기군 금강 일대 4헥타르의 버드나무 군락에 잎마름이 진행 중이며, 산지와 하천변의 버드나무와 때죽나무를 따라 꽃매미가 확산하고 있다.
효과적인 방제는 알 제거
현재 효과적인 살충제가 선별되어 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생태계 피해가 우려되고 주변으로 도피한 뒤 다시 날아들 수 있어 좋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알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알을 긁어내어 파괴하거나 열처리하여 부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
꽃매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앞으로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큰 외래종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속적으로 조사와 관찰을 하고 있으며, 올해 과학원이 발간한 [한국의 주요 외래생물 II]에 꽃매미를 수록하여 국민들에게 자세한 사진과 생태를 알리고 있다.
전자책자는 환경부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 당국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과 방제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이다.
※ 참고자료
김종민 외. 2010. 한국의 주요 외래생물 II. 국립환경과학원.
박지두 외. 2009. 꽃매미(Lycorma delicatula)의 생태 특성 및 약제 살충 효과. 한국응용곤충학회. 48(1):53-57
이정은 외. 2009. 식물에 대한 꽃매미의 섭식행동과 섭식자극.한국응용곤충학회.48(4): 467-477
국립환경과학원 보도자료: "외래종 꽃매미 한국의 추운 기후에서도 지속 출현 우려"
환경부 보도자료: "주요 외래생물의 길잡이 책자 발간"
환경부 보도자료: "집쥐, 가시상치 등 확산되는 외래종 관리 필요"
스크랩 출처 : 환경부 블로그 초록나래( http://blog.daum.net/mepr_greenwing/7632601)






 )
)